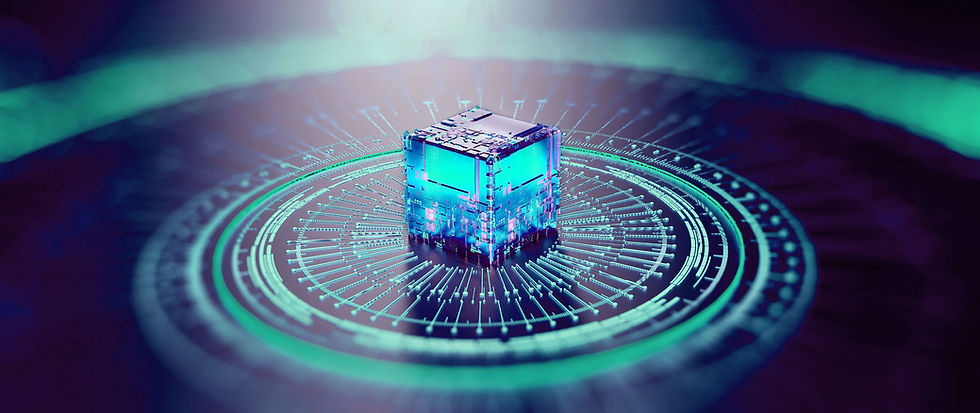집이 곧 계급인 나라
- Culture Today

- 2025년 8월 23일
- 3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5년 8월 29일

사진제공: wix
올여름, 세 아들과 함께 4주간 한국에 머물렀다. 공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차창 밖, 촘촘히 솟은 아파트숲은 여전히 경이로웠지만 그 풍경 속에 는보이지않는 질서가 흐르고 있었다. 한국에서 주소는 위치 정보가 아니라 일종의 자기소개서이자 신분 표지로 읽힌다. 강남·서초·송파, 성수·청담과 같은 지명은 지도상의 좌표를 넘어 한 인간과 가족의 기대치, 관계망, 심지어 미래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암호처럼 기능한다.
체류 내내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집값”이 단지 가격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디에 사느냐가 학군과 입시전략을 규정하고, 결혼과 직장 선택에까지 보이지 않는기준으로 스며든다. 집은생활의 그릇 이어야 하는데, 어느새 삶을 평가하는 저울이 되었다. 그 변화는 문화적 정서와 일상의 언어를 바꾸었다. “어디사세요?”라는 가벼운 인사가 곧 “어디에속하셨나요?”라는 질문으로 격상될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람 이전에 주소로 호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회적지위는생활양식으로드러난다.” — 막스베버
주거는 생활양식의 총합이다. 거주 지역은 소비패턴과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 관계망은 다시 지위를 강화한다. 이 순환을 끊지 못하면 계층의 거리는 ‘거리’가 아니라 ‘벽’이 된다. 한국에서집이 지위를 압도하는 기준으로 부상한 데에는 역사적 경험과 금융 구조, 교육경쟁이 한데 맞물린 사정이 있다. 전세와 대출이 제공한 레버리지는 상승기엔 효율 이었지만, 가격이 흔들릴때는 책임의 연쇄를 촉발한다. 상승의 기억은 길고, 하강의 충격은 짧지 않다. 그래서 “집은결국오른다”는 문장은 신화가 되고, 신화는 다시 행동을 낳는다. 이 믿음의 관성이 과열을 키우고, 역사는 이를 거품붕괴의 전주곡이라 기록한다.
“과시적소비는체면의언어다.” — 소스타인베블런
베블런의 통찰을 ‘거주’에 대입 해보면, 우리는 과시적 소비 대신 과시적 주소를 말하고 있는 셈이다. 체면은 대개 비용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종종 빚의 형태로 청구된다. 문제는 체면이 습관이 되는 순간, 빚의 속도가 삶의 속도가 된다는 점이다. 집이 자산인 동시에 의무가될 때, 우리는 사는 곳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운다. 그때 문화는 비전을 잃고, 예술은 질문을 잃는다. 문화와 예술이 사회의 상상력을 넓히는 대신, 상상력을 주소의 틀에 욱여 넣는 풍경.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시대의 표정 일지 모른다. 그 현실을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다.
정치는 이 사실을 누구 보다 잘 안다. 급등은 분노를 부르고, 급락은 공포를 부른다. 그래서 정책은 과열을 식히되 붕괴는 막으려 한다. “정치가경제를이긴다”는 냉소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그러나 정치가 민심의 비용을 늦출 수는 있어도, 구조의 청구서를 영원히 미룰 수는 없다. 빠른 고령화와 지역 불균형, 산업 지형의 재편은 주거 수요의 지도를 재작성하고 있다. “집은남고 사람이 없는” 도시가 상상이 아니라 통계와 체감으로 다가오는 순간, 과거의 경험치 ‘시간이 해결 한다’는 더 이상 낙관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가깝지만 먼나라인 일본의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토론토로 돌아오면 기준이 다원화된 사회의 완충력이 보인다. 여기서도 집은 중요하지만, 주소가 ‘결정적’인 잣대가 되지는 않는다. 직업의 안정성, 공적연금, 시민으로서의 참여, 다양한 가족형태와 라이프 스타일이 지위를 분산시킨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평가의 축이여러개라 한 축이 무너져도 사람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이것은 가능하다. 교육이 주소를 덜 보게 만드는 평가제도, 기업이 학벌·거주지 대신 역량을 보는 채용, 공공이 돌봄·문화·교통의 품질을 넓고 균등하게 보급하는 정책. 이 다중의 장치들이 모이면, 주소의 힘은 약해지고 사람의 서사가 힘을 되찾는다.
부모로서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길지 고민하게 된다. “좋은집에서살자”는 소망을 꾸짖을수는 없다. 다만 우리는 다음의 문장을 함께 배울 수 있다. 집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비교는 동력이 아니라 소모다. 빚의 속도를 삶의 속도로 착각하지 말자. 그리고 공동체의 질이 곧 자산의 질 임을 잊지말자. 좋은이웃, 좋은학교, 좋은공원은 부동산 광고의 수사로 주어지는것 이아니라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 지는 공공재다. 문화와 예술이야 말로 그 참여를 촉발하는가장 설득력 있는 언어다. 무용·연극·전시·문학은 우리가 살고 싶은 동네의 상상력을 먼저 세운다. 상상력이 없는 곳에 지속 가능한 가치가 축적될리 없다.
한국의 부동산은 투자, 계급, 정치, 심리가 얽힌 복합자산이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동시에, 비교와 체면, 두려움과 빚위에 세운 탑이기도 하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삶의가치를 정할 것인가. 주소인가, 직함인가, 아니면 우리가 쌓아 올린 관계와덕성, 시간의 품질인가. 여름밤 서울의 불빛을 떠올리며, 나는 조용히 이 문장을 적어둔다. 이 믿음의 관성이 과열을 키우고, 역사는 이를 거품붕괴의 전주곡이라 기록한다. 그 기준이야말로변동성 높은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인간적인 포트폴리오일 것이다.
관련영상 :
글 : 조재현 (문화저널 오늘 토론토 특파원/변호사)